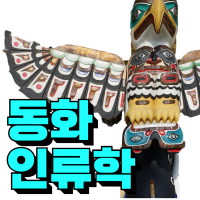
동화인류학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지금 여기의 삶을 완전히 긍정하는 주인공들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동화 속 주인공들은 정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주인공의 삶이 어디로 이끌릴지는 아무도 모르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규정 지을 수 없는 존재들이 온갖 살 궁리로 복작거리는 숲에서 깔깔 웃고 떠들며 놀다 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의 삶에 감사하며 한 걸음 더 낯선 길을 나서봅니다. 필요한 것은 모든 우연을 수용하고 마음껏 상상하는 것 뿐!
[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 아버지의 살
아버지의 살
트로브리안드의 아버지 장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이 대부분의 수고를 담당한다. 그들은 시신을 씻고 단장해야 하며, 시신을 묻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남자의 살을 맛보고, 뼈의 어떤 조각들은 석회 주걱으로, 두개골은 석회 단지로 사용하는 등의 다소 혐오감을 일으키는 장례 의무들을 수행해야 한다.”(『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①』, 유기쁨 옮김, 455쪽, 굵은 표시는 필자)
보답 의무
트로브리안드 섬에서 아버지의 장례 일은 아들들이 맡아 한다.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그럼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나? 아내가 베푼 성적 선물에 대한 답례다. 부부는 남편의 마을에서 가구를 형성하고 공동의 경제를 꾸려간다. 결혼은 단지 성적 교섭이 아니라 두 집단 간의 호혜 의무 계약이다. 이렇게 써놓으니 차가운 계약 관계인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트로브리안드 부부와 부자의 관계는 감정이라는 살을 입고 있는 신성하고 다정한 서약 관계다.
마르셀 모스는 “교환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상호 의무를 지는 것은 개인들이 아니라 집단들”이라고 했다.(『증여론』, 박세진 옮김, 파이돈, 25쪽) 트로브리안드 섬에서 부부는 두 ‘하위 씨족’(subclans) 간의 결혼 계약 단위이다. 부거제 결혼의 원칙에 따라, 남편은 아내를 마을로 맞이한다. 남편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매해 아내의 친족에게 식량 선물을 보내서 답례하는 “우리구부” 의무를 진다. 한편, 모계 혈통의 원칙에 따라 부부 사이에서 생긴 아이는 어머니의 신체 일부로 간주된다.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머니 쪽 집단이 아버지 쪽 집단에 주는 답례다.
증여와 보답 관계에서, 개인 사이의 거래로 간단히 물자를 교환하고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같은 책, 25쪽) 결혼으로 맺어진 집단 간의 호혜 의무는 당사자가 죽어야 끝난다. 집단 구성원들의 결혼 관계가 생기는 한, 집단 간에는 항구적으로 보답의 의무가 이어진다.
식인
아들은 아버지의 주검을 치장하고 영들의 세계로 돌려보낸다. 이것은 산 사람들의 공동체가 영들의 공동체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장례식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라는 두 집단 사이에도 증여의 교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들은 장례 때 왜 아버지의 살을 맛보는 행위를 할까? 이러한 장례 행위는 “토착민들에게도 혐오감을 일으키며, 구역질나거나 귀찮고 힘든 의무로 여겨진다.”(『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①』, 455쪽) 아들의 감정적 반응과 관련해서 역자는 말리노프스키가 『주술, 과학, 그리고 종교』에서 “시신을 맛보는 관습이 사랑과 갈망,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이중적인 감정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았다고 역주에 소개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달님샘은 아버지의 살을 맛보는 것이 족내 식인(endocannibalisme)이라며 로베르 에르츠의 “죽음과 이중 장례식”이라는 글을 소개했다. 족내 식인 관습이란 “친척들이 죽은 자의 살을 의례적으로 먹는”(『죽음과 오른손』, 26쪽) 행위다. 그것은 특정인만 참석하는 “성스러운 식사”(26)다. “이 관습을 통해 사람들은 죽은 자의 살에 남아 있는 생명력과 특성을 자기 몸 안에 통합한다. 만약 살을 부패하도록 내버려두면 공동체는 응당 자기에게 귀속될 힘을 잃고 만다.”(26) 뿐만 아니라, “그의 살은 ‘산 자들의 몸에 묻히는’ 가장 명예로운 매장을 보장받는다.”(26) 그러니까 이 행위는 일차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다. 아버지의 살은 예식을 통해 성체의 지위를 얻는다.
죽은 자의 입장에서도 엔도카니발리즘은 도움이 된다. “살은 부패하기 쉬운 불순한 것으로 뼈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26)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덕분에 “느리고 역겨운 부패 과정에서 벗어나며” 마치 화장을 하듯이 “그의 뼈는 거의 즉시 살이 다 떼어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26) 족내 식인은 죽음에서 최종 장례 사이의 기간에 죽은 자의 뼈를 노출하는 다양한 관습 중 하나라고 한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정화’에 수반되는 수고를 하면서 ‘오염’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들은 살아 있는 아버지와 함께 해온 일상으로부터 떼어내져서 시체와 접촉한다.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역겨움은 삶과 반대되는 죽음의 영역에 근접해 있다는 위기 경보이자 방어적인 감정일 것이다. 장례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들들이 아버지와 다른 씨족 집단에 속했다는 것은 죽음의 전염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리 유지 장치가 되어줄지도 모른다.
식사
타인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영들의 세계와 가까워지는 행위다. 남김없이 살을 발라 먹는 것은 선사의 식습관이다.(달님) 이것을 잘 하는 까마귀는 빠르게 정화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추앙받는 새라고 한다.(달님) 연습 문제를 풀어 보자. 우리말에 잔존한, 손님이 오면 닭을 잡는다는 풍속은 손님을 보내온 타 집단에 대한 답례다. 생각을 확장해 보자. 집에 온 손님과 밥상에 둘러앉아 닭의 살을 남김없이 발라 먹고 뼈만 남기는 행위는, 생명을 보내준 영들의 세계에 대한, 인간 집단의 보답 행위가 된다. 이와 같이, 선사의 사고에서 남의 살을 먹는다는 식사 행위는 장례식의 일환이 된다. 장례 식사는 타집단(타계 포함)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증여와 보답 의무를 지는 일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31 |
[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 아버지의 살
coolyule
|
2025.04.01
|
추천 0
|
조회 50
|
coolyule | 2025.04.01 | 0 | 50 |
| 30 |
『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 _ 고구마랑 말할 수 없는 ‘사람’
최수정
|
2025.03.11
|
추천 0
|
조회 47
|
최수정 | 2025.03.11 | 0 | 47 |
| 29 |
[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 공동체의 기술
남연아
|
2025.03.04
|
추천 0
|
조회 85
|
남연아 | 2025.03.04 | 0 | 85 |
| 28 |
[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 주술, 궁극의 연결술(2/19 후기) (1)
coolyule
|
2025.02.25
|
추천 0
|
조회 75
|
coolyule | 2025.02.25 | 0 | 75 |
| 27 |
[산호섬의 경작지와 주술-2/12수업후기] 경작의 필수요소, 주술 (1)
오켜니
|
2025.02.23
|
추천 0
|
조회 73
|
오켜니 | 2025.02.23 | 0 | 73 |
| 26 |
[학술제 후기] 안데르센 동화의 세계 속으로! (3)
남연아
|
2024.12.29
|
추천 0
|
조회 148
|
남연아 | 2024.12.29 | 0 | 148 |
| 25 |
[안데르센] 동화로서 영원을 꿈꾸다 (1)
오켜니
|
2024.12.21
|
추천 0
|
조회 167
|
오켜니 | 2024.12.21 | 0 | 167 |
| 24 |
[안데르센] 안데르센과 동화(2)
최수정
|
2024.12.13
|
추천 0
|
조회 94
|
최수정 | 2024.12.13 | 0 | 94 |
| 23 |
[까마귀 농부의 동화 읽기(마지막)] 겨울 축제 이야기 (1)
coolyule
|
2024.11.29
|
추천 0
|
조회 101
|
coolyule | 2024.11.29 | 0 | 101 |
| 22 |
[모던한 바다 엄마의 동화 읽기] 동화 속 먹고사니즘 (2)
남연아
|
2024.11.22
|
추천 1
|
조회 125
|
남연아 | 2024.11.22 | 1 | 125 |
| 21 |
떡갈나무에 대한 추도사 (1)
오켜니
|
2024.11.16
|
추천 0
|
조회 113
|
오켜니 | 2024.11.16 | 0 | 113 |
| 20 |
안데르센 동화의 힘 (1)
최수정
|
2024.11.08
|
추천 1
|
조회 144
|
최수정 | 2024.11.08 | 1 | 144 |
| 19 |
[뚜벅이의 동화 읽기] 독극물 낚시와 빨간 신 (1)
콩새
|
2024.11.01
|
추천 0
|
조회 167
|
콩새 | 2024.11.01 | 0 | 167 |
| 18 |
[까마귀 농부의 동화 읽기] 이야기한다는 것 (1)
coolyule
|
2024.10.25
|
추천 0
|
조회 196
|
coolyule | 2024.10.25 | 0 | 196 |
| 17 |
안락의자에 누운 낡은 가로등 (3)
오켜니
|
2024.10.19
|
추천 0
|
조회 152
|
오켜니 | 2024.10.19 | 0 | 152 |
| 16 |
미야자와 겐지와 안데르센의 의인화 (1)
최수정
|
2024.10.11
|
추천 0
|
조회 220
|
최수정 | 2024.10.11 | 0 | 220 |
| 15 |
[뚜벅이의 동화 읽기] 프레임을 깨는 미야자와 겐지 (3)
콩새
|
2024.10.04
|
추천 0
|
조회 145
|
콩새 | 2024.10.04 | 0 | 145 |
| 14 |
[까마귀 농부의 동화 읽기] 미야자와 겐지의 가난관 (4)
coolyule
|
2024.09.27
|
추천 0
|
조회 192
|
coolyule | 2024.09.27 | 0 | 192 |
| 13 |
[모던한 바다 엄마의 동화 읽기] 미야자와 겐지라는 새로운 렌즈 (4)
남연아
|
2024.09.20
|
추천 0
|
조회 230
|
남연아 | 2024.09.20 | 0 | 230 |
| 12 |
상상력의 리얼리티 (1)
최수정
|
2024.09.13
|
추천 0
|
조회 226
|
최수정 | 2024.09.13 | 0 |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