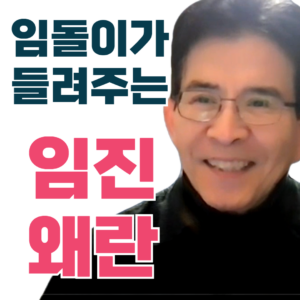
<임(진왜란) 돌(아보기) 코너>에서는 허남린 선생님께서 최근 푸~욱 빠져계시는 임진왜란 연구의 경험, 쟁점, 즐거움 등에 대한 산문을 격월로 게재합니다. 허남린 선생님은 캐나다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아시아학과에서 일본사를 가르치고 계시며, 현재 인문세에서 일본 철학과 조선 연행사 세미나를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쓰신 책으로는 『조선시대 속의 일본』, 『처음 읽는 정유재란 1597』, 『두 조선의 여성:신체·언어·심성』, 『Prayer and Play in Late Tokugawa Japan』, 『Death and Social Order in Tokugawa Japan』이 있습니다.
권력과 폭력에 묻힌 침묵을 찾아
권력과 폭력에 묻힌 침묵을 찾아
허남린 선생님(캐나다 UBC 아시아학과 교수)
임진왜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조선의 인구는 3퍼센트에서 5퍼센트나 줄어든 것으로 추량된다. 이는 오십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추계이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적 추계가 가능한데, 조선의 전체 인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인구를 추정한 학자들은 있다. 이들의 널뛰기 추정치에 사망자 추계치를 대입하면 전체 인구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가 된다.
지금의 남한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낮게 잡아 3퍼센트면 백오십만이고, 5퍼센트면 이백오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엄청난 숫자이다. 왜침의 참화는 조선의 구석구석에 미쳤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벼락처럼 내려친 망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난한 세월을 살아가야 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당연히 왜적과 맞서 싸운 병졸들도 많이 있었다. 지금의 언어를 빌린다면, 국가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인 셈이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호국영령들을 만나게 된다. 유족들이 찾고, 시민들도 찾고, 정치인들도 자주 찾는다. 지금의 국가가 보전된 것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조선의 국왕 선조는 어떠했을까? 전쟁이 끝나고 호국영령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이들의 영혼을 달랬을까? 남은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위로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무참하게 희생되었고, 전쟁은 끝이 났고, 왕조는 살아남았다. 그 살아남은 왕조의 주인은 국왕 선조였다. 자기 왕조가 살아남은 것은 자신이 지배하는 인민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 국왕 선조는 그들에게 공적을 돌리고, 자기 왕조를 구해줘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렸을까?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국왕 선조가 전쟁 중에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조선의 군인들 가운데 몇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 조사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임진왜란에서 희생된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다.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이다. 왕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왕 선조는 이들 다수에게 무슨 특별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가가 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진정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자기 나라 인민들의 목숨에는 눈 하나 깜짝 않던 그는 그러나 중국 명나라에서 와서 목숨을 잃은 몇몇 장수들에 대해서는 달랐다. 이들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해마다 제물을 바쳤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살아서 돌아간 명나라 장수들을 위해서도 사당을 세우고, 조선에 오지는 않았지만 구원군을 보내는데 공헌한 병부상서 석성을 위해서도 사당을 세우고 공경을 표시했다. 전쟁을 치른 당사자인 선조뿐만 아니라, 후대의 조선의 국왕들은 명나라 장수들에 대한 제사를 조선말까지 이어갔다.
전근대 국가에서의 인민들은 그냥 절대 권력의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조선을 침략하다 패퇴한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정권도 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조선을 침략하면서 일본군은 30~40퍼센트가 여러 원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침략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의 정권도 얼마나 많은 자기 나라 군병들이 외국에서 죽었는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몇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남은 자들은 그저 다시금 권력 투쟁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중국 명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 파병했던 군인들 가운데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조사를 했다는 기록은 전무하다. 때문에 10만 가까이 파병한 군병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조선의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중국의 사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있을 턱이 없다. 중국의 군병들도 황제의 절대 권력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한 존재들이었다.
국립묘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어느 나라를 가나 대동소이한 풍경을 만난다. 희생한 사람들의 영혼을 기리고, 국가 차원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근현대의 산물이다.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인민들은 그저 절대 권력의 도구에 불과했다. 자신의 왕조를 위해 수많은 인민들이 죽어 나가도 그들 독재 권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전이 아니다.
권력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 즉 개념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 상이한 개념을 무시한 채, 그 같은 단어를 갖고 “나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마구잡이로 이해하려 할 때는 우리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무슨 보편적 개념인 것처럼 여기저기에 갖다 붙이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우기면 다 되는 줄 알지만 턱도 없는 만용이자 그냥 무식일 뿐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 권력에 대한 자기 독단의 생각을 마치 보편적 개념인 것처럼 믿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옛날의 왕들처럼, 독단적 권력자는 항상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더 악질은 그 권력이 정말로 전근대의 왕의 권력인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러한 부류의 권력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의 독단적 권력은 타자를 모두 자기 권력의 하수인으로 여긴다. 현대 사회의 이해에도 권력은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이다.
임진왜란 연구의 열쇠도 종국에는 권력의 이해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언어를 갖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개념들을 갖고, 몇 백 년의 세월을 거슬러 내려가 과거의 권력을 꿰뚫어 보고, 그 작동구조를 통찰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조선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중국을 망라하여, 각기 나름의 특성을 갖는 권력 구조를 탈경계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국왕 선조는 자기를 위해 싸우다 죽은 인민들을 위해 제사를 올리기는커녕, 자기를 위해 싸우다 죽는 충성스런 인민들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한탄을 하곤 했다. 명 황제는 전장에서 군사들이 배고픔에 죽던 말던 자기의 애첩들을 보석으로 감싸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환관들을 전국에 보내 인민들을 쥐어짜기에 몰두했다. 히데요시는 자기 아들의 권력을 위해, 한때 후계자로 삼았던 조카의 일족을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한 자리에 모아 놓고 39명의 목을 쳤다. 히데요시는 정말 악독한 놈이었다.
권력과 폭력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여기에 빌붙어 권력을 향유했던 소수의 인간군은 사회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군림했지만, 대다수 인민들은 권력의 폭력 밑에서 뜯기고 숨죽이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이 내는 목소리는 권력 앞에서는 침묵으로 화했다. 그런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묻혀버린 다수의 침묵을 찾아내어 그 의미를 파고드는 끈기가 필요하다. 그들의 침묵이 권력의 본질을 역으로 가장 잘 비추어 주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의 연구는 어쩌면 이러한 무한히 묻혀 있는 침묵을 찾아 이를 파헤쳐 가는 끝도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다. 어디에선가 외치고 있는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8 |
되살아난 “천조국”의 망령 (1)
진진
|
2025.07.14
|
추천 0
|
조회 46
|
진진 | 2025.07.14 | 0 | 46 |
| 7 |
히데요시의 권력욕과 조선 침략 (4)
진진
|
2025.05.11
|
추천 0
|
조회 77
|
진진 | 2025.05.11 | 0 | 77 |
| 6 |
전란의 기아와 권력 (2)
진진
|
2025.03.11
|
추천 0
|
조회 80
|
진진 | 2025.03.11 | 0 | 80 |
| 5 |
권력과 폭력에 묻힌 침묵을 찾아 (2)
진진
|
2025.01.09
|
추천 0
|
조회 102
|
진진 | 2025.01.09 | 0 | 102 |
| 4 |
콩알과 거대한 바위 (4)
진진
|
2024.11.10
|
추천 0
|
조회 118
|
진진 | 2024.11.10 | 0 | 118 |
| 3 |
(허남린 선생님 인터뷰) 영화 <전,란Uprising>에 대한 타임지 기사
인문세
|
2024.10.17
|
추천 1
|
조회 167
|
인문세 | 2024.10.17 | 1 | 167 |
| 2 |
단조로움과 즐거움의 역설 (4)
진진
|
2024.09.10
|
추천 0
|
조회 233
|
진진 | 2024.09.10 | 0 | 233 |
| 1 |
임돌이 코너 시작하며 (1)
inmoonse
|
2024.06.21
|
추천 0
|
조회 305
|
inmoonse | 2024.06.21 | 0 | 305 |
나를 위해 죽을 이가 왜 이리 부족하냐. . 이 대목에 이르르니, 정말 괴롭습니다. 나의 옳음을 떠받치는 것은 어떤 권력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선생님 말씀으로 배웁니다. 정말로 나는,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무한히 묻혀 있는 침묵을 깨트리고, 구조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에 필요한 끈기. ‘끈기’야말로 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마주할 방법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권력과 폭력에 묻힌 ‘침묵’의 의미를 찾아 연구한다는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끝도 없는 여정이지만 그 침묵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사라져가기도 한 이들에 시간과 마음을 기울이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선생님 덕분에 그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