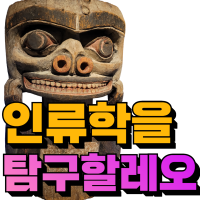
인류학은 일상과 다른 상상력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구석기에서 살아가려면 먼 곳에서도 물을 구할 천리안, 웬만한 도구는 만들 수 있는 손, 간단한 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하고, 무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빠르게 자기 역할을 찾는 맥락 파악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남에게 군림받거나 군림해서도 안됩니다. 한마디로 자연학적 지식, 기술,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남의 돈 벌기가 싶냐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무기력하게 사는 것 말고도 다른 옵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봅니다. 어쩌면 나도 몰랐던 다른 가능성, 이를테면 효율, 이익과 무관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엇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고, 그저 친구들과 아무런 이해나 계산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런 멋진 상상을 말이죠.
[빙하 이후(1)] 『레비스트로스의 말』 차가운 사회, 뜨거운 사회
구석기 사회가 현대사회까지 변모한 것은 필연과 진보일까요?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현대사회가 구석기보다 우월한 사회도 아니고 그 변화도 필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없고, 그냥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 현대사회가 더, 심지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지,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제대로 댈 수 없거나 잘못 아는 내용을 제시하기가 쉽습니다. 구석기에 대한 무지, 무시에 대한 재고부터 할 필요를 느낍니다.
연재의 첫 글은 윤연주 선생님의 『레비스트로스의 말』 발제문입니다.
———————————————————
[빙하 이후(1)> 레비스트로스의 말] 차가운 사회, 뜨거운 사회
윤연주
객관적으로 말해 현대사회와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부르는 민족들의 사회는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입니다. (중략) 우리는 문명을 매우 복잡한 조합으로 여깁니다. 수천 개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거기서부터 출발해봅시다. 우리는 문명을 매우 복잡한 조합으로 여깁니다. 수천 개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분자와 아주 적은 수로만 이루어진 간단한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들의 결합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모델은 다릅니다. 크기순이거나 조합의 복잡성순이거나, 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략) 그런데 만약 125번에 그 조합을 구현한다면, 그 앞의 모든 시도는 결국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야 그것을 구현한 것입니다. 좀 더 늦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매번 처음인 것인지 진보가 아닙니다. 성공의 필수 조건이 이어지는 진보성이 아니라 매번 처음 시동하는 한 방, 한 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당신이 제기했던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당신이 제기했던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런 복잡한 조합을 구현했고, 그것이 서구 문명이라고 명명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수백만 번이라는 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아주 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훨씬 뒤에, 아주 나중에 그것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제 말은, 그냥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류재화 옮김,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조르주 샤르보니에 지음, , 39~40쪽)
레비스트로스는 원시사회와 근대사회를 두 가지의 기계 작동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는 열역학 제2 법칙에 나오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를 기계역학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과 회와 열역학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의 변화를 엔트로피로 나타낸다. 자연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에 따르면 원시사회는 친족 관계의 규칙, 경제적 교환 등으로 차이보다는 규칙과 주기를 완성하는 사회적 장치들로 작동한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의 사회는 ‘시스템 내부 온도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차별화에 따른 격차이다. 계급, 경제력 등의 차이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를 우리는 진보한다고 생각하는데, 진보는 필연적으로 엔트로피, 즉 무질서를 동반한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투쟁 등이 이런 무질서의 예이다. 이런 사회의 더 큰 문제는 이런 차이가 유지되어야 사회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노예제도가 식민주의,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로 변화하듯이 차이는 모양을 계속 바꾸면서 우리 사회를 작동시킨다. 나는 평등을 요구하고 평등 사회를 구현한다는 정치적 슬로건이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허황된 거짓말이고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 내부의 차이를 원료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어떠한 차이도 없는 평등은 사회를 해체하자는 말과 다름없을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일반적으로 성적이 나아지는 것처럼 나는 사회를 점점 나아지고 있는 진보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사회의 변화를 진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그 순간에 구현되고 출현한 것이다. 석기 시대의 기술들을 축적해야만 청동기 시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변화의 출현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