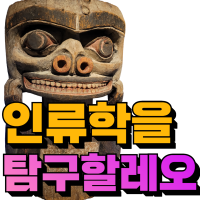
인류학은 일상과 다른 상상력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구석기에서 살아가려면 먼 곳에서도 물을 구할 천리안, 웬만한 도구는 만들 수 있는 손, 간단한 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하고, 무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빠르게 자기 역할을 찾는 맥락 파악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남에게 군림받거나 군림해서도 안됩니다. 한마디로 자연학적 지식, 기술,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남의 돈 벌기가 싶냐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무기력하게 사는 것 말고도 다른 옵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봅니다. 어쩌면 나도 몰랐던 다른 가능성, 이를테면 효율, 이익과 무관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엇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고, 그저 친구들과 아무런 이해나 계산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런 멋진 상상을 말이죠.
[빙하 이후(8)] 고고학과 집단 정체성
고고학이란 매우 희소한 양의 유물을 통해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생활상을 떠올리는 학문입니다. 고고학이 국가주의와 결합 되면, ‘최초, 최대’, ‘우리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많습니다. 선사 시대는 국가가 없던 시기인데, ‘원래’ 한국에서 정주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전파를 했다거나, 시작이 일본이냐, 한반도냐는 다툼을 선사 시대인들이 듣는다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할 일입니다.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선조’의 생활, 생각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KBO 프로야구는 슈퍼루키이자 슈퍼스타를 동시에 거머쥔, ‘도니살’(도영아 니땀시 살아야) 기아 김도영 선수 때문에 열풍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글은 인류학의 슈퍼루키로 출발했다가 마무리에는 슈퍼스타가 되신 손유나 선생님의 ‘고고학과 집단 정체성’에 대한 글입니다.
———————————————————————-
고고학과 집단 정체성
손유나
고고학은 까마득한 과거를 다루는 학문으로 현재와 미래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도 덜 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고고학이 대중의 관심사되는 것은 집단의 ‘우월성’ 혹은 ‘독보성’을 보여줄 수 있을 때이다. 고고학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집단의 자부심을 드높여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쉽다. 18~19세기 유럽에서 이루어진 선사시대의 연구는 인종주의나 민족주의와 결부하여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고, 반대편에서는 민족의식을 고취해 제국의 침략에 방어하기 위해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고고학을 이용하였다. 『빙하 이후』에서 여행자로 나오는 존 러복 또한 유럽인이 우월하다고 믿는 인종주의 시각을 가진 학자였다.
고고학은 민족과 인종 이미지 외에도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1971년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는 필리핀 남부 코타바토 밀림에서 현대사회와 고립된 채 살아가던 수렵채집민 ‘타사다이’ 족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986년 마르코스 정권이 붕괴하고 ‘완전한 원시 부족 타사다이’는 날조였음이 밝혀졌다. 이들은 필리핀 소수민족으로 원경을 하며 살아가던 무리였다. 이 날조극은 당시 마르코스 정권이 “자연 및 다른 사람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부드럽고 평화를 사랑하는 타사다이족은 동남아시아 다른 곳의 생활과는 너무 대조”(434)되는 모습을 내세워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자신들의 독재정권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쇼였다.
2000년도 일본의 후지무라 신이치가 자행한 석기 유물 날조도 같은 맥락이다. 후지무라 신이치는 일본에서 70만 년 전 석기를 발견하여 일본에 전기 구석기 문명이 존재했음을 증명했다. 발굴된 석기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었지만 일본 고고학계는 이를 무시했고 그의 이론은 일본 교과서에 실리기까지 했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후지무라의 발굴이 사기였음이 밝혀졌는데 이 날조의 배경에는 한국 연천군 전곡리에서 전기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어 일본 학계가 자극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다. 이 사건은 기원이 오래되었을수록 우월하고, 일본이 구석기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욕망으로 일어났다.
『빙하 이후』에서 소개되었던 아메리카의 클로비스 논쟁 또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바라보려는 시각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의 용감한 개척자이자 사냥꾼의 이미지를 위해 어쩌면 초기 아메리카인들이 배를 타고 다시마를 먹으며 내려왔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 역시 역사를 자아도취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유럽은 주먹도끼, 동아시아는 찍개를 사용한 문화권으로 유럽인이 우월하고 아시아인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뫼비우스의 인종차별적인 이론을 뒤엎은 유물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지며 어깨가 으쓱해진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서 주먹도끼로 살아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적의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식의 날조와 억지스러운 해석은 왜일까? 고고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선사시대 연구가 인종주의 혹은 민족주의와 결부하여 발전을 해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고고학이란 학문에 집단 정체성을 고취하는데 좋은 요소가 있기 때문인지 궁금해진다. 시대는 변했고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는 한풀 꺾였고,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비롯한 수많은 발굴 기법이 발전하여 객관성 확보가 이전보다는 쉬워졌다. 그럼에도 선사시대는 절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에 취약하고, 집단의식을 고취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뚜렷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항상 존재한다. 이를 보면 고고학을 단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여기기에는 부족하고,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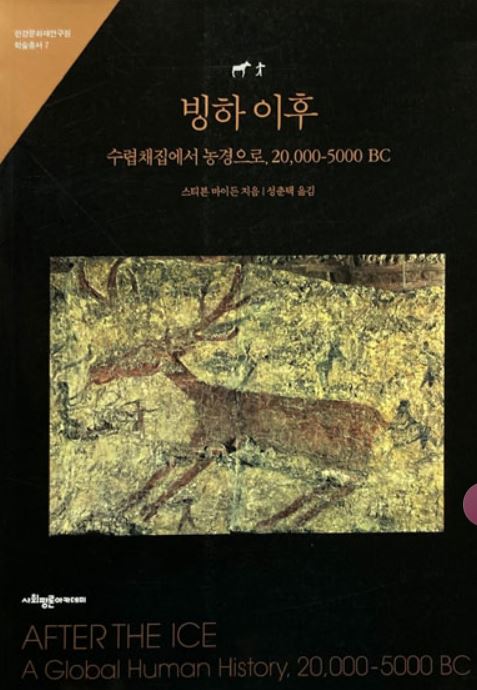
스티븐 마이든(Steven Mithen, 1960년)